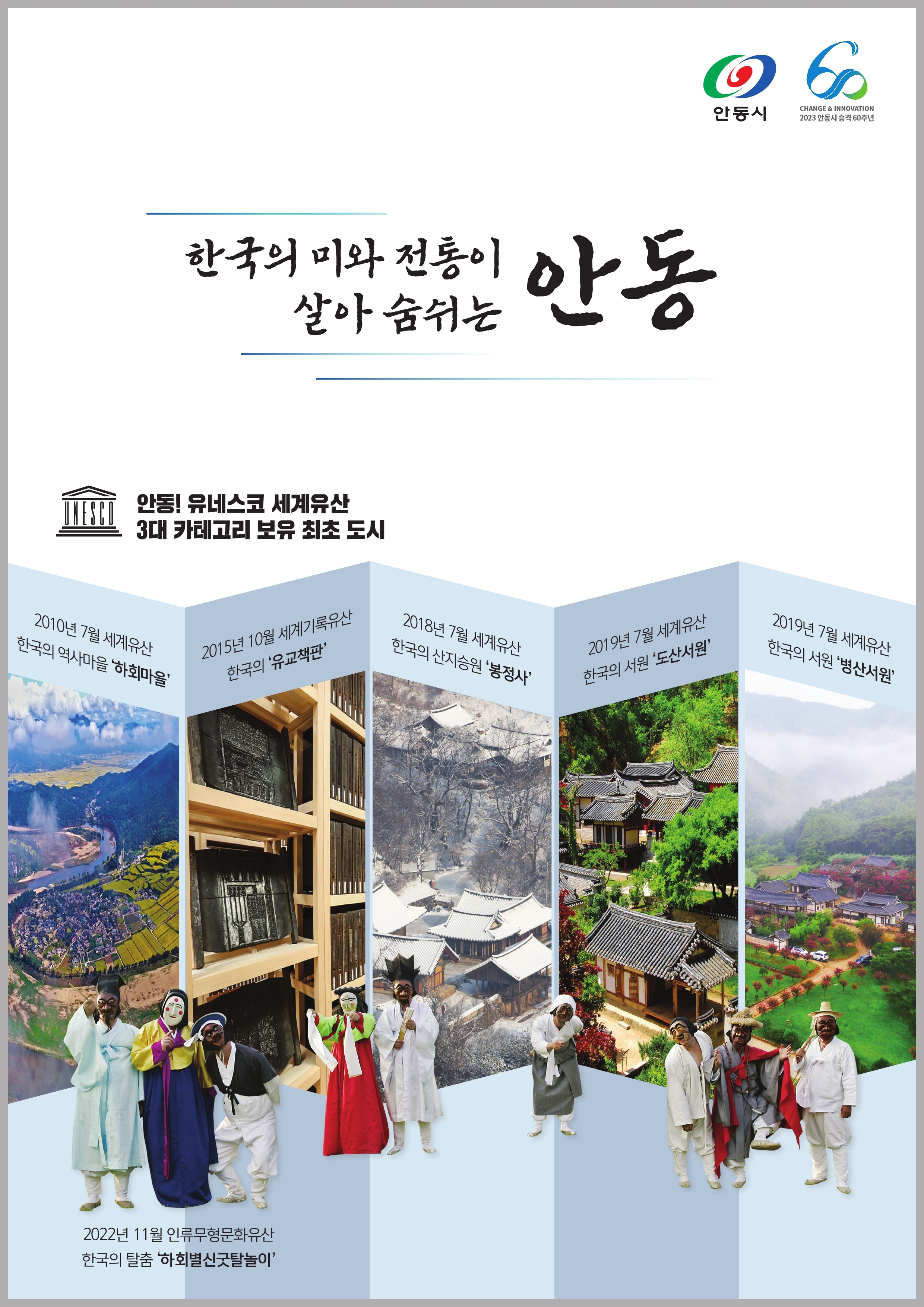|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게 새집 다오.”
오래된 전래 동요의 한 대목인데 시간이 흘러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미래의 문을 통해 아이들이 꿈꾸는 세상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배경 음악으로 정해진 바 있으니 결코 남의 나라 동요는 아니다.
오늘은 집에 대해 짚어볼 말이 있어 죄 없는 두꺼비를 불러냈다. 사람도 동물도 먹고 자는 것은 유사하다. 먹이야 생태계의 원칙에 따라 각자가 해결할 일이고 자는 것도 동물은 서식처를 두고 있고 인간도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들기 위한 서식처를 만든다.
초가집에서 슬래브 건물로, 다시 아파트에서 이제는 오피스텔과 전원주택 등 주거 형태도 다양하다. 그런데 어째 서식처가 재산증식의 도구가 되고 동물과 달리 한명이 수 십 채를 갖고 있는가 하면 한 채도 없어 임대료를 주고 셋방살이 서러움을 겪는 일이 있으니 비교우위에서는 동물보다 못한 신세다.
농촌이야 빈집이 널렸고 주택구입비도 저렴하지만 죽어라 서울·수도권으로 몰리니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것이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지방에 넉넉한 평수와 마당까지 있는 집이 수도 없이 넘쳐남에도 단칸방이 다닥다닥 붙은 고시원이라도 서울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무슨 달팽이도 아니고 걸핏하면 이삿짐을 싸고 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농현상은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급기야 정부가 국토균형발전법을 정하고 지방으로 주요 관공서를 분산 배치했지만 그런다고 달라질 리 없었다.
필자가 뜬금없이 집에 대해 논하는 것은 얼마 전 폭우로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반지하에 거주하던 국민이 죄 없이 운명한 사건 때문이다. 일차적으로 117년 만에 폭우가 온다고 어느 정도라도 예보가 맞았다면 가만히 집에 앉아 죽음을 맞이하진 않았을 것이다.
물론 재산피해도 상당했지만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기상청의 예보에 익숙해진 국민들이 딱히 폭우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이번 폭우에 대해 정부는 또 오두방정을 떨었다. 서울만 해도 20만 가구에 육박하는 반지하 주택을 어느 날 갑자기 없앤다는 오세훈 시장의 일몰제 정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난 피해마다 반복된 규제 방식도 비슷하고 이주 대책은 예산 제약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거실태 조사를 거쳐 현실적인 대책을 추진 해야 함에도 한번씩 문제가 발생하면 당장이라도 해결책을 내세우지만, 비가 그치거나 불이 꺼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뒤처리의 결과가 없다.
서울시내 반지하 주택 20만 호의 대체 거주지로 시내 258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아파트가 거론되자 혹시 입주 순번이 밀리거나 임대인도 아닌 반지하 주민들이 임대주택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 부각되고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임대 11만8,000호 재건축의 대다수는 서울시 마음대로 재건축할 수 없는 주택이며 안전진단상 문제가 없는 주택을 30년이 됐다고 무조건 재건축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투성이라는 지적이다. 신축 공공임대 아파트 건축 비용과 매입 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예산 문제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20만 호의 대체 물량을 확보한다는 것은 뚜렷한 근거나 합리적인 추론이 따라야 할 문제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최근 5년간 시내 공공택지에 공급한 아파트 평균 건축비는 3.3㎡당 600만 원으로 전용 59㎡의 예를 들자면 약 1억5,000만 원 수준인데 고밀 재건축으로 4,000가구를 짓는다면 공사비만 약 6,000억 원에 이른다.
최근 국제분쟁으로 인한 유류비 인상까지 고려해 공사비 인상분을 반영하면 비용은 더 늘어난다. 문제는 오란다고 올 것이며 가란다고 갈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공한 반지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79.4%가 타 지역 공공임대주택 이전을 거절했다는 결과를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집이란 짓는 자보다 입주해서 살 사람의 입장과 의사를 먼저 알아야 한다. 무슨 닭장도 아니고 덮어놓고 지어본들 입주를 거부하면 억지로 집어넣을 것인가. 설령 짓는다 해도 신축 공공임대 아파트가 모든 반지하주택 수요를 대체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반지하는 창문을 열고 햇빛을 볼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환경을 벗어난 주거 형태다. 반대로 옥상에 지어진 창고처럼 비좁은 공간도 마찬가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고시원이라는 곳은 말 그대로 고시 공부를 해야 하는 곳인데 어쩌다 가난한 사람들의 임시거처가 되어 열악한 환경속에 겨우 잠만 자는 곳이 되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지하·옥탑방·고시원의 합성어인 ‘지옥고’라는 단어다. 현재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이 서울에서만 20만 가구, 전국적으로 32만7,000 가구가 있다. 대안이 있다면 빈집도 채우고 국토발전의 균형을 찾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정부는 최근 270만 가구 공급을 골자로 한 8·16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재생 사업에 50조원이 투자됐지만 벽화 그리기, 전시실 만들기 등에 그쳤다. 저렴 주택의 대량 멸실을 전제로 한 정부의 섣부른 정책이 자칫 저렴 주택 임대료 대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마당과 골목이 사라지고 아이들의 요란한 재잘거림이 함께 사라졌다. 자고로 집이란 아늑하고 평안함을 구할 수 있는 쉼터여야 하는데 어쩌다 집이 부의 상징이 되고 인간의 욕심은 한계선을 넘어 바벨탑처럼 마천루가 즐비한 세상이 되었다.
편리함을 구하기 위한 초고층 빌딩은 문명이라는 공통된 변화 앞에 눈에 보이는 얻은 것과 보이지 않는 분실도 많다. 오늘도 해 저문 골목길에서 숨바꼭질을 하다 하나 둘씩 각자의 집으로 저녁 밥 먹으러 가고 혼자 남아 멍하니 서있던 기억이 아스라이 난다.
<저작권자 ⓒ 문화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